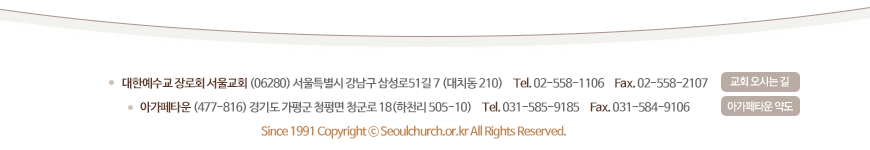구세군은 종종 사회사업 기관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어엿한 교회이다.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이름이 잘 드러내듯이 신학이나 예전, 종교적 체험 같은 종교 내적의 문제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신앙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제와 봉사에 적극적인 구세군의 특징은 기독교 교파의 다양성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구세군을 사회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구세군의 한국 선교는 1908년에 시작되었다. 한국 진출에는 후발주자인 셈이다. 그러나 선교초기 구세군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선교 개시 8개월 만에 3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구세군의 빠른 성장은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의 결과이다. 구세군은 선교사들이 내한하자마자 바로 통역인을 고용하여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노방 순회전도에 나섰다. 다른 교파들의 선교사들이 내한 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차분히 선교를 준비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속도전이었다.
그런데 이 빠른 선교 착수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영어에 능통하지 않았던 통역인들이 구세군이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모르는 채 통역에 나섰던 것이었다. 많은 경우 한국인 통역인들은 구세군을 영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돕기 위해 파견한 군대로 이해했다. 게다가 통역인의 상당수는 애초에 설교를 통역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레짐작한 대로 설교를 통역했다. 그 결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구세군 사관(구세군에서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의 설교는 구세군에 들어오면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지급한다는 말로 와전되었다. 이런 오해는 국권을 지키고 싶었던 민족주의 성향의 조선인들을 구세군으로 마구 끌어들였다. 일부 조선인 신자들은 자신들끼리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자신들이 구세군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종교적 목적 없이 구세군에 들어온 이들이 빠져나갔지만 그중 일부는 구세군에 남았다. 그 결과 초기 한국구세군에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이 많았다.
1920년대로 넘어오면 한국교회 안에 한국인 리더십이 성장하면서 선교사 중심의 교회구조를 비판하는 일이 많아졌다.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 한 명인 한석진이 ‘선교사들은 이제 그만 한국을 떠나라’고 말하고 그 말에 항의하는 마펫(Samuel A. Moffett)에게 “당장 한국을 떠나시오. 여기 더 있으면 백해무익한 존재가 될 뿐이오”라고 일갈한 것도 1925년의 일이었다. 구세군도 선교사와 한국인들의 갈등이 커져갔다. 더욱이 구세군은 군대식의 엄격한 명령체계를 가진 반면 자주와 독립의식에 투철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1926년 11월, 칠순을 맞아 세계 선교지역 순방에 나선 세계구세군 대장 브람웰 부스(Bramwell Booth)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한국인 사관들은 대장이 한국을 방문할 때 선교사관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회 운영에 한국인이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양인 사관 중 일부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 및 재정관리에서 한국인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급여도 문제였는데 당시 한국인 사관은 서양인 사관의 1/8, 일본인 사관은 1/5의 급여를 받았다. 극심한 생활고와 차별대우에 지친 한국인 사관들은 진정서를 읽은 대장이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진정서를 전달하려는 한국인 사관과 이를 막으려는 서양인 사관 사이에 난장판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서의 내용은 브람웰 부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이 못 마땅했던 부스는 예정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며 모두 군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인 사관 50여 명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무더기 면직되었다. 사관학교(신학교)는 문을 닫았고, 학생도 전원 퇴학 처리되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한국인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교회에 남을 리 없었다. 1928년 순식간에 구세군의 교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단순히 교세만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선교 이래 꾸준히 구호와 자선사업에 나서며 쌓은 사회적 신뢰와 애정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위기 앞에서 구세군은 다시 초심을 발휘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명을 하거나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묵묵히 세상에 자신이 어떤 조직인지 다시 보여주었다. 1928년 한국 구세군은 새로운 구호사업을 실시했다. 바로 ‘자선냄비’ 사업이었다. 1928년은 극심한 흉년으로 대규모의 구호사업이 필요한 해였고 구세군은 그해 겨울 더욱 적극적으로 빈민구제사업에 나섰다. 그리고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선냄비를 실시한 것이었다. 자선냄비는 구세군이 서양인의 단체가 아니라 굶주리는 한국인을 위한 단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다시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세군이 위기를 돌파하는 순간이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다. 본 회퍼는 그의 시 “나는 누구인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